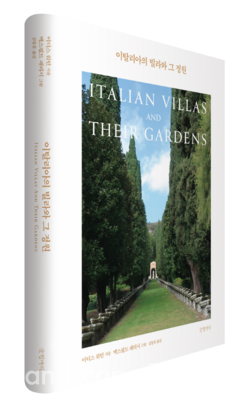
이디스 워턴의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1904)이 출간된 지 120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워턴은 19세기 후반 미국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이탈리아에 살았던 적이 있다. 수시로 미국과 유럽을 오갔으며, 이탈리아어에 능통했다. 그녀가 작가로서의 명성을 쌓던 41세 되던 해, 한 잡지사로부터 이탈리아 정원에 관한 글을 의뢰받는다.
그렇게 떠난 수개월에 걸친 현지 취재여행의 산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 정원뿐 아니라 서양 정원에 관한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히며,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여행기이자 에세이, 정원 해설서이자 조경 분석서인 이 책은 우리를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로 되돌려놓고, 이탈리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원으로 옮겨놓는다.
워턴은 책의 첫 문장에서 “이탈리아의 정원은 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정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책은 최고의 이탈리아 정원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혜안이 도처에서 번득인다.
그밖에 다른 책에서 찾을 수 없는 강점은 우아한 문체와 절제된 감상, 그리고 공정한 평가에 있다. 무미건조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서도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종종 감상을 드러내지만 절제한다.
이 책은 지적인 즐거움 역시 풍부하게 선사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 북부 유럽과 바다 건너 영미를 넘나들며 역사와 예술, 문학, 건축을 말하고 있다.
역자는 헌법재판소의 현직 헌법연구관 겸 공보관이다. 법조인으로서는 특이하게 서울 근교와 시골 옛 할머니 댁에서 정원과 텃밭을 오랫동안 가꾸어온 정원 마니아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이탈리아 로마 유학 시절 우연히 이 책을 만났다. 그 후로 빌라와 정원 공부를 하는 한편, 틈틈이 방문하고 구석구석 사진도 찍었는데 이 책에 실린 사진은 대부분 그가 정성들여 찍은 것들이다. 역자는 이 책이 우리 정원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어려운 번역 작업을 사명감으로 완수했다.
그는 역자 서문에서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묘사와 설명,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간간이 드러나는 감상과 평가가 적절히 어우러져 우리를 이탈리아의 정원 속을 거닐도록 만듭니다”라고 독자에게 권한다.
이 책에 소개된 빌라와 정원들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살아남아 있다. 옛 귀족 가문의 사유지로서 초청 없이는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이제는 명승지로 지정되어 입장료를 낸 방문객에게 개방되는 곳도 있다. 정반대로, 주인의 손길을 받지 못해 평범한 아니 퇴락한 도시의 공원이 되어 버린 곳도 있다.
몽테뉴가 말했듯,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 나답게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이방의 여행을 통해 나를 찾아가듯이, 이탈리아의 정원을 통해 한국의 정원이란 무엇인지, 한국다운 정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한국조경신문]
- [새책안내] 공원의 위로
- [새책안내] 경관계획 방법론
- [새책안내] 태도 Ⅰ·Ⅱ
- [새책안내] 식물과 춤추는 인생정원
- [새책안내] 시경(詩境)으로 본 한국정원문화
- [새책안내] 학교숲 정원 이야기
- [새책안내] 인생정원
- [새책안내] 나무는 오늘도 사랑을 꿈꾼다
- [새책안내] 숲이라는 세계
- [새책안내] 한국의 기념경관
- 국립수목원, 공동체정원 조성 ·관리 가이드북 발간
- [이불 밖은 위험해, 겨울에는 이 책] 12월 추천 도서
- [이불 밖은 위험해, 겨울에는 이 책] 1월 추천 도서
- [새책안내] 공원주의자-도시에서 초록빛 이야기를 만듭니다.
- [이불 밖은 위험해, 겨울에는 이 책] 2월 추천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