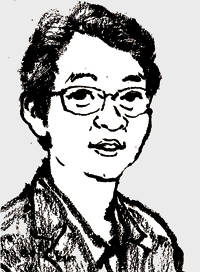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한국조경신문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경문화 창달의 가치를 가지고 ‘친절한 보도, 가까운 신문, 행복한 독자’의 사시(社是)로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조경신문은 올 겨울 이른 한파만큼이나 찬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주)한국조경신문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누적된 손실로 인한 경영부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조경신문을 아끼고 사랑해준 독자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며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조경신문은 언제 다시 시작할 기약이 없는 휴간(休刊)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선 한국조경신문이 잘 못해온 점을 반성해봅니다. 첫째, 언론의 역할인 옳은 말을 하고 부당한 일에 대하여 비판과 비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광고 수주가 신문사 유지의 절대적 요인인데 광고 영업에 전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란 이유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셋째, 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전담직원이 전화로 구독료 납부 요청을 드리는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측면에서도 경영 악화의 요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광고비 미수금이 해마다 누적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조경시설물 제조업체가 가장 큰 악성채권을 남겨놓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지금의 한국조경신문의 현실을 초래한 가장 큰 공헌자입니다. 둘째, 한국조경신문 구독료 미수입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조경기술자가 약 10만 명인데 겨우 2% 정도의 조경인만이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가장 크게 생각되는 조경인들의 무심함과 외면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조경신문에게 쓴소리도 하고 취재를 와달라고 하면서 광고는커녕 구독료도 안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구독료 지로용지를 보내면 신문만 보고 지로용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경신문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첫째, (주)한국조경신문을 인수하는 사업자가 나서는 것입니다. 자본금도 적고 부채도 많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조경신문 10년의 발자취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지가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둘째, 밀린 광고비가 어느 정도 지불이 되고 공짜 독자들도 구독료를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조경기술인의 5%만 유료 구독을 해줘도 현재의 광고와 함께 한국조경신문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자주주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1988년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되고 독자들이 소액주주가 되어 설립된 한겨레신문이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현재의 환경이라면 아무리 사재를 털어 넣어도 ‘凍足放尿(동족방뇨,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조경계 발전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버텨왔지만, 악순환 고리에 접어든 후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조경신문에 애정을 쏟아주신 독자와 광고주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기보다는 1달 전이라도 사정을 아뢰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어 엎드려 글을 올립니다. 한국조경신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실 독자제현께서는 e-mail(kbs3942@latimes.kr)로 고견을 보내주십시요.
| <알림> 주간 한국조경신문이 2017년12월까지 발간 후 휴간에 들어갑니다. 수 년간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해 더이상 신문 발행을 이어갈 힘이 없습니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모든 조경뉴스 발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조경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휴간 중이라도 정상화 방안을 찾아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한국조경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