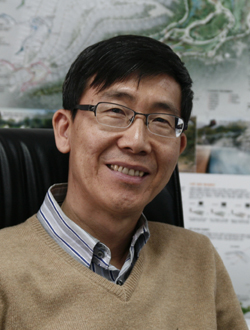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식단으로 구성된 세끼 식사를 하고 자동차나 전철 등을 타고 출퇴근을 하며, 한낮에도 전등을 켜고 냉난방이 갖춰진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본다. 또한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읽고 TV를 시청하며, 때때로 친구를 만나 왁자지껄한 호프집에서 술 한 잔 나누고 밤늦도록 도시의 열기에 빠져보기도 한다. 귀가해서는 땀과 먼지와 음식냄새에 절은 옷을 벗어 세탁기를 돌리고 상수도를 틀어 샤워를 한다. 나의 하루 삶의 흔적이며, 당신의 그것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의 흔적도 이렇게 쌓여갈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지구를 살아가는 최적의 방식인양….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지구 자원이 필요할까,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돌아보며 저마다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반드시 한번쯤 짚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누리는 삶은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우리는 고기나 생선을 매일 먹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먹는 이 음식은 500㎞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입해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서 나는 지역 토산물인가? 또 이것은 제철 과일인가? 매일 내 휴지통에서는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가? 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사는가, 아니면 개인주택에서 사는가? 우리 집에서 1인당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매주 내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걸어서 이동하는가,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하는가? 자동차는 얼마나 타고 다니며, 어떤 차(배기량)를 타는가? 혼자서 타고 다니는가, 아니면 여럿이 함께 타고 다니는가? 1년에 비행기는 몇 번이나 타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이 지구 자원에 얼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다. 즉 각 개인이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해내고 그 폐기물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술적으로 계산한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생태발자국지수란 1996년 캐나다의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걸(Mathis Wackernagel)과 윌리엄 리스(William Rees)가 개발한 개념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생산 및 폐기에 드는 비용, 즉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것이다. 단위는 1인당 헥타르(㏊)로 표기하며, 그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자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태파괴지수’라고도 할 수 있다.
생태도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한데 반해 생태발자국지수는 지속가능성 중에서 생태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척도로 전환하여 간결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속가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지금까지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자연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연의 수용능력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한 개념이다.
보통 생태발자국지수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인구 전체로 확대되며, 이로써 한 도시나 한 지역, 혹은 한 나라의 생태발자국지수 측정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70억 명이 살고 있는 지구 전체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 정체상태를 보이던 생태발자국지수는 196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이전까지는 생태발자국지수와 지구인구의 곱이 지구 전체의 면적을 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이후 생태발자국지수가 지구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지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감당해낼 수 있는 면적이 2.24㏊인데 반해 인류의 생태발자국지수는 2.7㏊로 나타났다.
즉 인류는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30퍼센트 더 많은 양을 지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대륙별로 보면 그 불균형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여 북미는 약 2배, 유렵은 약 2.5배의 생태발자국지수를 보이는 등 남미대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5년부터 생태발자국지수가 생태수용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3.0㏊의 지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녹색연합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치의 지수를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생태용량의 초과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달리 말하면, 인류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지구는 달걀 꾸러미안의 달걀이나 골퍼의 캐디백 속 골프공처럼 하나를 써버리거나 없어지면 다른 걸 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하나뿐이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우리가 석유, 가스, 석탄 등 재생능력이 없는 화석에너지 자원을 채굴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삼림 목재 자원이나 수산 자원 등이 충분히 재생되거나 번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갈되기 쉬운 자연 자본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들 자본이 생산해내는 연간 이익에 국한되어 살아가야 하는 처지임을 망각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온 인류가 자연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 하던 원시 야생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며 올바른 해결책 또한 될 수 없다. 개인적 방법으로는 생태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의 추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 정책 또는 시스템적 해결방안의 하나로는 회색 인프라 구축위주의 정책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지금까지의 녹색 인프라는 구호에 불과했다).
앞서 간 발자국이라고 모두 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패인 발자국은 덫이 되어 뒤에 오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 지구는 우리 세대에서만 쓰고 폐기되는 소비재가 아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진승범(객원 논설위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