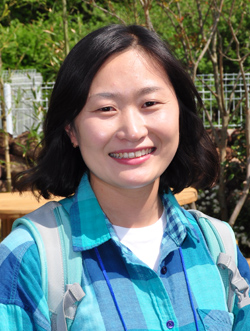
그런데 또 지각을 하고야 말았다. 20분. 게이트까지 나와 준 조경신문 관계자도 황송한데 해설이 벌써 시작했다니 마음이 너무 급해졌다. 이윽고 다다른 정원은 많은 뚜벅이들이 진지한 자세로 해설을 경청하고 있었다. 나도 슬쩍 끼어들었다. 뚜벅이들은 명찰을 패용한다고 했는데 명찰이 없는 분들도 많이 섞여있었다.
17개의 정원은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 해설사는 구역간 거리가 너무 멀고 한 장소에 모아놓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구역간 거리는 멀었지만 정원간 거리는 여운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각 구역별로 어린이를 위한 정원, 조형성이 강한 정원,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정원 등을 골고루 분배해 놓은 것 같았다. 1구역부터 설명이 이어졌다. 각 정원별로 작가 소개를 하고 테마, 의미, 에피소드, 식재기법 등으로 해설이 이어졌다. 해설을 들으니 이해하기 쉽고 작가의 의도를 알고 나니 정원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 정원인 것처럼 정답고 내 정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디기탈리스, 풍차데모르, 알리섬, 헨리 오토드롭, 황색느릅나무, 캐나다 박태기 등 신품종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다양한 조경재료들과 개비온(돌망태) 기법, 초화류식재 기법 등도 배울 수 있었다. 속리산 이끼를 찾아다니고 돌망태에 하나 하나 돌을 넣고 새벽에까지 나와 정원을 만들던 작가정신도 느낄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보였다. 내려놓음 정원에서는 작가의 의도처럼 정말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평상에 올라가 담소를 나누었다. 광풍제월 누각에서는 호수공원을 바라보다 눈을 감고 대나무 바람소리를 듣고, 평창의 자작나무 퍼걸러에 앉아 시원한 숲 속의 느낌과 계곡의 물소리에 흠뻑 취했다. 아이들도 신이 났다. 마음이 자라나는 플레이 가든 하얀 모래 위에 손자국을 남기던 아이들도, 진흙밭 정원에서 개굴개굴 소리를 내며 수련 잎 위를 뛰놀던 남자 아이도 기억에 남는다.
2014 코리아 가든쇼의 주제는 힐링가든(Healing Garden)이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치유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가든 디자이너 역시 인간이 만든 역사와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었으며 지친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줬다. 알지 못했던 국내의 훌륭한 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구 조경과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어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정원을 보며 가든 디자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만한 열정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나도 ‘화계비원’같은 내 인생을 담은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정원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사치품이다. 왜냐하면 정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귀해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간, 관심 그리고 공간을...”
저명한 조경가 디터 키나스트 교수의 말이다. 정원을 만들고 가꾸려면 많은 시간과 관심, 공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치진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다. 이번 가든쇼가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안목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원이 서비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침체된 조경 산업에 활기를 주고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떨결에 처음으로 참여한 뚜벅이 프로그램이었지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관련기사

